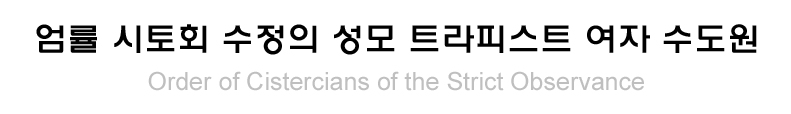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15년 6월의 말씀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그림은 1818년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방랑자라는 제목이 선뜻 와닿지 않고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어 그림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선 거친 파도를 연상케 하는 짙은 안개가 압도적으로 와닿습니다. 온통 시야를 가로막는 저 속, 몇 겹의 능선과 계곡이 신비롭게 겹쳐져 사람의 접근을 허락 않는 듯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거친 바위들이 불쑥불쑥 솟아, 나무들은 그 위에 간신히 서있는데, 저너머 안개에 반쯤 가린 산 또한 희미하지만 웅장한 모습이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의 한복판에 한 인간이 떡 버티고 서있습니다. 자칫 파괴적일 수도 있는 이 웅장한 자연을 한 인간이 관조하거나 명상하는 모습은 아닌 듯 합니다. 왼쪽 손은 주머니에 넣은 듯 한데, 보통 사람들이 높은 사람 앞에서나 자연 경관에 압도당할 때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는 듯 어깨를 활짝 펴고 고개를 당당히 세워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표정이 어떨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는지요? 더욱이 화가가 이 경관의 한 복판 그것도 중심에 인간을 두었다는 사실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이 그림에서 인간은 결코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을 관장하고 지배하며 심지어 통제하고변화시킬 수도 있는 주체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입니다. 주인이기에 자신이 뜻하는 대로 바꾼다 한들 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러한 사상은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풍조가 현대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하느님마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부재로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그 사고가 떡하니 제 앞에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빛나는 이성의 힘으로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그 이전 수천 년 동안의 발전의 몇 백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가히 위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발달된 기술로 뱃속에 잉태된 자신의 생명마저 함부로 죽이고, 수천만 년 생성되어온 강줄기도 함부로 파헤치고, 발전을 위해서는 열대 밀림도 시베리아 숲도 마구 베어버려 지구는 몸살을 앓고, 무기를 팔기 위해서는 일부러 적을 만들고, 발달된 문명을 누리느라 생성된 쓰레기는 처치곤란에, 오염으로 뜨거워진 지구의 기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을 기술도 문명도 과학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핵쓰레기, 전세계를 파괴하고도 남을 핵폭탄은 또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장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만큼 지구의 멸망을 걱정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살아간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삶의 종말인 죽음조차 과거 사람들에 비해 제대로 준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해체되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정신병은 이제 감기를 앓는 일만큼이나 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고귀함이 자연 위에 우뚝 서서 마음대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소중함이 과학의 발전만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참행복이 물질이 있다 하여 얻어지는가요? 참된 자유가 우주를 여행한다 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일까? 하느님 없는 이성,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발전의 끝이 이제는 보이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사막의 수도자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을 때가 되지 않았는지요? 역설적인 의미에서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제목은 잘 맞는 듯 합니다.